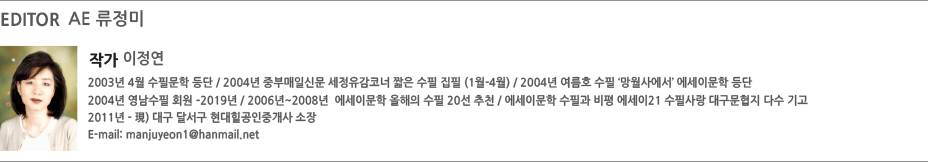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고욤
2023-06-1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고욤
'글. 이정연'
고욤 맛을 안다는 것은 겨울밤의 서정을 안다는 뜻이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 이마를 내밀고 깔깔거리며 언니와 고욤 씨를 내뱉던 추억, 누구 고욤 씨가 더 멀리 날아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욤 씨는 뱉는 족족 하얀 눈밭에 깊이 박혀 버렸으므로.
고향집의 그 늙은 고욤나무는 어찌 되었을까. 우리들도 다 떠나 버리자 아버지는 사촌오빠를 시켜 집에 그늘만 드리운다며 베어 버렸을 것이다. 가엾은 고욤나무, 한 때는 우리들의 간식을 조달하는 나무로 사랑받을 때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나 썩은 밑둥치라도 남았을까 하고 살펴보았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밑둥치까지 아궁이에 넣어져 몸을 태워 방을 데우곤 재가 되어 쓸쓸히 텃밭 어디쯤 뿌려지지 않았을까.
고향집에는 유실수가 많았다. 모a과나무 감나무 앵두나무 모두 어엿한 제 자리를 차지하고 사랑받았는데 고욤나무는 사랑채 모퉁이에 가까스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의붓자식처럼 홀대 받았다. 살뜰한 어머니마저 다른 가을걷이를 모두 끝내고 서리 맞은 감까지 따서 큰 독에 짚을 깔고 차곡차곡 넣어 둔 다음에야 비로소 고욤나무로 눈길을 주셨다. 오빠한테 고욤을 따라고 몇 번 그래보시다가 오빠가 차일피일 미루자 마지못해 당신이 직접 고욤을 따기 시작하셨다.

무슨 영문인지 어머니는 장대로 고욤을 터시다가 나머지는 긴 사다리를 놓고 나무에 올라가 실톱으로 가지를 하나하나 베어 내리셨다. 언니와 나는 멍석에 앉아 어머니가 베어서 던져 주시는 가지에 앙증맞게 붙은 고욤을 하나하나 꼭지를 따서 항아리에 담고 빈 가지는 사랑채 쇠죽 끓이는 아궁이 앞에 쌓아 두었다. 가지 째 베어버린 고욤나무에게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올려다보면 나무 뒤로 파란 하늘이 쨍 소리 날 듯 펼쳐져 있었다.
고욤나무는 그렇게 가지를 다 잘라 버려도 아무런 원망도 지니지 않은 채 이듬해 봄이면 싹을 내고 새로 뻗은 가지마다 비좁도록 꽃을 피웠다. 녹음도 짙어지고 뻐꾸기 소리도 식상한 유월 어느 날 우연히 고욤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언뜻 이슬비 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나무 밑에 서 보았더니 그건 놀랍게도 고욤 꽃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푸르도록 하얀 작은 꽃이 빈틈없이 떨어져 내린 마당에 계속해서 꽃이 떨어져 내렸다.
가을이면 고욤나무는 제 설움은 까마득히 잊은 채 가지가 휘도록 고욤을 달고 햇살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잘 익은 과육에 햇살이 투과하면 작은 열매들이 마치 자수정처럼 말갛게 고왔다. 우리 집 고욤은 여느 집 고욤과는 좀 다른 종류였다. 과육은 별로 없고 씨만 많은 둥근 고욤이 아니라 열 개 중 서너 개 정도는 씨가 없고 있더라도 한 개 아니면 두 세 개정도의 씨만 있을 뿐 육질이 과피를 꽉 채운 맵시 있는 타원형이었다.
그 정도면 사랑 받을 이유가 충분했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던 건 고욤은 먹어도 도무지 배가 부르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간식으로 먹는 것도 제일 나중에 선택되었다. 큰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홍시도 얼추 먹고, 윗목 함지박의 왕겨 속에 묻어 두었던 고구마도 바닥을 드러내고 텃밭에 묻어 두었던 무까지 손을 대고 난 뒤, 겨울이 깊을 대로 깊었을 때에야 어머니는 고욤 항아리 뚜껑을 여셨다. 항아리 속 고욤은 저절로 얼었다 녹았다하며 물러 터지고 단물이 나와 조청처럼 한데 엉겨 붙어 있었다.

고욤은 아무리 일없는 겨울이라도 낮에 먹기에는 좀 그렇다. 쫄깃하게 엉겨 문드러진 과육 사이의 씨를 발라내려면 긴긴 겨울밤에 푸근하게 시간을 두고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욤은 허기를 면하기 위해 먹는 게 아니다. 겨울밤의 무료를 달래주는데 고욤만한 게 있을까. 노란 양은 양재기에 담긴 고욤을 놋숟가락으로 한 숟갈 뜨면 기다렸다는 듯 부엉이가 '나 좀 다오' 하듯 울었다.
깊은 산골바람은 밤을 달려 문풍지에 더욱 슬피 우는데 온 식구가 화로 곁에 놓인 고욤양재기 곁으로 둘러앉아 혓바닥이 아릿해지도록 고욤을 먹었다. 언젠가 우연히 고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목성균 선생님은 펄쩍 뛰며 반색을 하셨다."정연씨가 고욤을 다 아세요?" 선생님은 내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과일 고욤의 맛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신 게 아니라 눈 내리는 겨울밤의 서정과 고욤양재기 곁에 둘러앉은 가족의 단란함을 아느냐고 물으신 줄을 나는 금방 알아들었다.
별도 추워서 얼어버린 밤 문풍지는 더욱 날카롭게 울고 댓돌위에 가지런히 놓인 크고 작은 고무신을 눈발이 차츰 덮어간다. 찌그러진 고욤 양재기를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조금씩 나누던 가난한 행복, 호롱불에 비친 우물살문엔 동그랗게 둘러앉은 가족의 그림자가 너울거리고 초가는 눈 속에 점점 깊이 파묻혀 가는데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계곡에서 화답처럼 들려오는 노루 울음소리, 그 겨울밤을 고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집의 그 늙은 고욤나무는 어찌 되었을까. 우리들도 다 떠나 버리자 아버지는 사촌오빠를 시켜 집에 그늘만 드리운다며 베어 버렸을 것이다. 가엾은 고욤나무, 한 때는 우리들의 간식을 조달하는 나무로 사랑받을 때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나 썩은 밑둥치라도 남았을까 하고 살펴보았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밑둥치까지 아궁이에 넣어져 몸을 태워 방을 데우곤 재가 되어 쓸쓸히 텃밭 어디쯤 뿌려지지 않았을까.
고향집에는 유실수가 많았다. 모a과나무 감나무 앵두나무 모두 어엿한 제 자리를 차지하고 사랑받았는데 고욤나무는 사랑채 모퉁이에 가까스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의붓자식처럼 홀대 받았다. 살뜰한 어머니마저 다른 가을걷이를 모두 끝내고 서리 맞은 감까지 따서 큰 독에 짚을 깔고 차곡차곡 넣어 둔 다음에야 비로소 고욤나무로 눈길을 주셨다. 오빠한테 고욤을 따라고 몇 번 그래보시다가 오빠가 차일피일 미루자 마지못해 당신이 직접 고욤을 따기 시작하셨다.

무슨 영문인지 어머니는 장대로 고욤을 터시다가 나머지는 긴 사다리를 놓고 나무에 올라가 실톱으로 가지를 하나하나 베어 내리셨다. 언니와 나는 멍석에 앉아 어머니가 베어서 던져 주시는 가지에 앙증맞게 붙은 고욤을 하나하나 꼭지를 따서 항아리에 담고 빈 가지는 사랑채 쇠죽 끓이는 아궁이 앞에 쌓아 두었다. 가지 째 베어버린 고욤나무에게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올려다보면 나무 뒤로 파란 하늘이 쨍 소리 날 듯 펼쳐져 있었다.
고욤나무는 그렇게 가지를 다 잘라 버려도 아무런 원망도 지니지 않은 채 이듬해 봄이면 싹을 내고 새로 뻗은 가지마다 비좁도록 꽃을 피웠다. 녹음도 짙어지고 뻐꾸기 소리도 식상한 유월 어느 날 우연히 고욤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언뜻 이슬비 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나무 밑에 서 보았더니 그건 놀랍게도 고욤 꽃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푸르도록 하얀 작은 꽃이 빈틈없이 떨어져 내린 마당에 계속해서 꽃이 떨어져 내렸다.
가을이면 고욤나무는 제 설움은 까마득히 잊은 채 가지가 휘도록 고욤을 달고 햇살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잘 익은 과육에 햇살이 투과하면 작은 열매들이 마치 자수정처럼 말갛게 고왔다. 우리 집 고욤은 여느 집 고욤과는 좀 다른 종류였다. 과육은 별로 없고 씨만 많은 둥근 고욤이 아니라 열 개 중 서너 개 정도는 씨가 없고 있더라도 한 개 아니면 두 세 개정도의 씨만 있을 뿐 육질이 과피를 꽉 채운 맵시 있는 타원형이었다.
그 정도면 사랑 받을 이유가 충분했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던 건 고욤은 먹어도 도무지 배가 부르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간식으로 먹는 것도 제일 나중에 선택되었다. 큰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홍시도 얼추 먹고, 윗목 함지박의 왕겨 속에 묻어 두었던 고구마도 바닥을 드러내고 텃밭에 묻어 두었던 무까지 손을 대고 난 뒤, 겨울이 깊을 대로 깊었을 때에야 어머니는 고욤 항아리 뚜껑을 여셨다. 항아리 속 고욤은 저절로 얼었다 녹았다하며 물러 터지고 단물이 나와 조청처럼 한데 엉겨 붙어 있었다.

고욤은 아무리 일없는 겨울이라도 낮에 먹기에는 좀 그렇다. 쫄깃하게 엉겨 문드러진 과육 사이의 씨를 발라내려면 긴긴 겨울밤에 푸근하게 시간을 두고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욤은 허기를 면하기 위해 먹는 게 아니다. 겨울밤의 무료를 달래주는데 고욤만한 게 있을까. 노란 양은 양재기에 담긴 고욤을 놋숟가락으로 한 숟갈 뜨면 기다렸다는 듯 부엉이가 '나 좀 다오' 하듯 울었다.
깊은 산골바람은 밤을 달려 문풍지에 더욱 슬피 우는데 온 식구가 화로 곁에 놓인 고욤양재기 곁으로 둘러앉아 혓바닥이 아릿해지도록 고욤을 먹었다. 언젠가 우연히 고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목성균 선생님은 펄쩍 뛰며 반색을 하셨다."정연씨가 고욤을 다 아세요?" 선생님은 내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과일 고욤의 맛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신 게 아니라 눈 내리는 겨울밤의 서정과 고욤양재기 곁에 둘러앉은 가족의 단란함을 아느냐고 물으신 줄을 나는 금방 알아들었다.
별도 추워서 얼어버린 밤 문풍지는 더욱 날카롭게 울고 댓돌위에 가지런히 놓인 크고 작은 고무신을 눈발이 차츰 덮어간다. 찌그러진 고욤 양재기를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조금씩 나누던 가난한 행복, 호롱불에 비친 우물살문엔 동그랗게 둘러앉은 가족의 그림자가 너울거리고 초가는 눈 속에 점점 깊이 파묻혀 가는데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계곡에서 화답처럼 들려오는 노루 울음소리, 그 겨울밤을 고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