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최명임 작가
cmi3057@naver.com
2024-08-07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누가累家와 이별하고
'글. 최명임'
불현듯 발길 이끌려 고향 집에 왔다. 빈집에 공허한 바람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병상에 둔 채 어머니도 샛길로 달려 오셨을까. 어머니와 부엌을 들여다보고 비 들친 마루에 이끼 낀 서글픔을 어루만져보았다. 마루를 지나 우물 앞에 섰다. 해가 떠오르다 풍덩 잠기는 곳, 어머니가 물을 퍼 올린다. 두레박에 넘치는 물이 아버지의 등으로, 머리로 흙 묻은 발로 시원스레 쏟아진다. 수고한 지아비의 등에서 땀방울이 흩어져 내린다. 그 곁에 차가운 우물물로 물첨벙 하고 노는 우리가 새파래진 입술로 와글거린다.
부엌에는 장작 타는 소리에 밥물이 넘치고 된장국 냄새가 더운 바람을 타고 마당으로 달아난다. 처마 밑에 호롱불이 켜지고 들마루 저녁상에 수저 부딪는 소리가 정답다. 모깃불 타는 냄새 코끝이 아린 초저녁, 밥상을 물린 들마루에 삼삼오오 삼베 이불을 덮고 눕는다. 무수하게 많은 별이 하늘을 뒤덮고 아이들은 쏟아지는 별을 헤다가 스르르 잠이 든다.

추억에서 깨어나니 불씨 꺼져버린 아궁이에 타다만 장작이 제멋대로 뒹굴고 마당엔 잡풀이 무성하다. 어머니의 손에서 반질거리던 장독과 무쇠솥은 누구의 손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을까. 지붕은 한 귀퉁이가 내려앉고 문설주에 가뭇가뭇 검버섯이 피었다. 막내가 침 발라서 구멍 내던 문짝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삭은 문풍지가 세월에 찢기어 너풀너풀 사라질 때마다 ‘돌아오마.’ 하고 떠난 주인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내, 서글픈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더니 빛바랜 어머니의 세간들이 드러누웠다. 과거를 회상하다 막 잠이 들었나 보다. 고향 집에 남겨두고 갔던 우리의 체취가 방구들에 배어 있다가 꾸역꾸역 살아나온다.
사방에서 풍겨 나오는 어머니 체취가 마구마구 내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구수한 된장 냄새도 섞여 있고 풀냄새도 배었고 꽃냄새도 배었다. 적삼에서 나던 땀 냄새도 질곡의 세월이 남긴 아릿함도 물큰하게 배어있다. 그리운 사람들의 두런거림이, 그리운 체취들이 나의 살 속을 파고든다.
뼈대만 남은 우리 집이 어머니를 닮았다. 고목 등걸처럼 누워 있는 어머니 모습이다. 서로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한 몸처럼 늙었다. 고향에서 병상에서 함께 사그라지고 있다. 어머니가 가시면 고향 집도 가버릴 듯, 지금은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다.
어머니는 열다섯 살에 시집와서 낯선 이 집과 정 붙이느라 꽤 오래 마음을 앓았단다. 서모가 낳은 여덟 시누이와 업어 키운 시동생까지 혼인시켰고 피붙이들 낳아 가르치고 출가시켰다. 종부의 몫인들 녹록했으랴. 평생을 이 집에서 희로애락을 맛본 어머니는 자식 따라 도시에 가자고 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하더니, 오빠를 잃고 난 뒤에 미련 없이 고향을 등졌다.

사립 옆 꽃밭에다 이야기를 심어놓고 뒤뜰에 대나무와 감나무로 포부를 심었는데, 그곳 두고 발길 무거워서 어찌 나섰을까. 어머니의 뜰에 피어난 여덟 자식 숨 가쁘게 키워냈건만, 새파란 큰 아들을 먼저 보내고 막내까지 놓쳐버린 뒤에 어머니는 살 힘을 잃어버렸다. 타향살이도 어찌어찌 정 붙이고 잘 지낸다고 하더니 잊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던 탓일까. 치매가 오더니 말문도 닫아버렸다. 그리곤 오빠와 막내를 찾아 먼 길 떠나버렸다.
유일하게 남은 소싯적 사진 한 장, 참 고운 시절이 어머니에게도 있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감고 말릴 때마다 고역이라던 어머니가 흑발을 빗어 넘겨 비녀를 꽂고 환하게 웃고 있다. 그 위로 어머니 파마한 백발이 겹친다. 병상에 누워서 집에 가자고 하더니 끝내 가지 못하고 한 움큼 재가 되어 고향에 가신 날, 어머니 냄새가 진동하였다. 부디 땅에 묻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달라기에 유언대로 아버지의 산소 옆에다 흩뿌렸다. 어머니는 바람을 타고 훌훌 어디론가 날아갔다.
누군가 죽은 이가 문득 생각날 때는 그 영혼이 저를 찾아온 거라고 말했다.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들의 체취가 훅훅 끼쳐질 때가 있다. 어머니는 저세상에서 아들을 만나 무척 행복하겠지만, 두고 간 피붙이들이 또 그리워서 가끔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싶다.
어느 날 창문을 열면 어머니에게서 나던 흙냄새와 꽃냄새와 땀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 와 나를 와락 덮친다. 잘살고 있느냐고, 그리웠다고.
어머니가 가신 뒤에도 일 년에 한 번은 고향 집엘 갔었다. 행여 내가 가는 날 어머니도 오실까 하고. 누가累家의 체취가 어머니를 닮았는지 어머니 체취가 누가에 배었는지 흠씬 취하곤 하였다. 이제는 집이 거기 있었다는 흔적만 남긴 채 빈 터가 되어버렸다. 낱낱이 흩어진 누가의 조각들이 풀숲에 덮이고 그 많은 추억도 나의 가슴속으로 옮겨놓았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마지막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불현듯 고향 집이 생각나면 그리우니 한 번 다녀가라는 고향의 기별인 줄 알고 달려가서 만나 보아야겠다.
EDITOR 편집팀
부엌에는 장작 타는 소리에 밥물이 넘치고 된장국 냄새가 더운 바람을 타고 마당으로 달아난다. 처마 밑에 호롱불이 켜지고 들마루 저녁상에 수저 부딪는 소리가 정답다. 모깃불 타는 냄새 코끝이 아린 초저녁, 밥상을 물린 들마루에 삼삼오오 삼베 이불을 덮고 눕는다. 무수하게 많은 별이 하늘을 뒤덮고 아이들은 쏟아지는 별을 헤다가 스르르 잠이 든다.

추억에서 깨어나니 불씨 꺼져버린 아궁이에 타다만 장작이 제멋대로 뒹굴고 마당엔 잡풀이 무성하다. 어머니의 손에서 반질거리던 장독과 무쇠솥은 누구의 손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을까. 지붕은 한 귀퉁이가 내려앉고 문설주에 가뭇가뭇 검버섯이 피었다. 막내가 침 발라서 구멍 내던 문짝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삭은 문풍지가 세월에 찢기어 너풀너풀 사라질 때마다 ‘돌아오마.’ 하고 떠난 주인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내, 서글픈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더니 빛바랜 어머니의 세간들이 드러누웠다. 과거를 회상하다 막 잠이 들었나 보다. 고향 집에 남겨두고 갔던 우리의 체취가 방구들에 배어 있다가 꾸역꾸역 살아나온다.
사방에서 풍겨 나오는 어머니 체취가 마구마구 내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구수한 된장 냄새도 섞여 있고 풀냄새도 배었고 꽃냄새도 배었다. 적삼에서 나던 땀 냄새도 질곡의 세월이 남긴 아릿함도 물큰하게 배어있다. 그리운 사람들의 두런거림이, 그리운 체취들이 나의 살 속을 파고든다.
뼈대만 남은 우리 집이 어머니를 닮았다. 고목 등걸처럼 누워 있는 어머니 모습이다. 서로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한 몸처럼 늙었다. 고향에서 병상에서 함께 사그라지고 있다. 어머니가 가시면 고향 집도 가버릴 듯, 지금은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다.
어머니는 열다섯 살에 시집와서 낯선 이 집과 정 붙이느라 꽤 오래 마음을 앓았단다. 서모가 낳은 여덟 시누이와 업어 키운 시동생까지 혼인시켰고 피붙이들 낳아 가르치고 출가시켰다. 종부의 몫인들 녹록했으랴. 평생을 이 집에서 희로애락을 맛본 어머니는 자식 따라 도시에 가자고 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하더니, 오빠를 잃고 난 뒤에 미련 없이 고향을 등졌다.

사립 옆 꽃밭에다 이야기를 심어놓고 뒤뜰에 대나무와 감나무로 포부를 심었는데, 그곳 두고 발길 무거워서 어찌 나섰을까. 어머니의 뜰에 피어난 여덟 자식 숨 가쁘게 키워냈건만, 새파란 큰 아들을 먼저 보내고 막내까지 놓쳐버린 뒤에 어머니는 살 힘을 잃어버렸다. 타향살이도 어찌어찌 정 붙이고 잘 지낸다고 하더니 잊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던 탓일까. 치매가 오더니 말문도 닫아버렸다. 그리곤 오빠와 막내를 찾아 먼 길 떠나버렸다.
유일하게 남은 소싯적 사진 한 장, 참 고운 시절이 어머니에게도 있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감고 말릴 때마다 고역이라던 어머니가 흑발을 빗어 넘겨 비녀를 꽂고 환하게 웃고 있다. 그 위로 어머니 파마한 백발이 겹친다. 병상에 누워서 집에 가자고 하더니 끝내 가지 못하고 한 움큼 재가 되어 고향에 가신 날, 어머니 냄새가 진동하였다. 부디 땅에 묻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달라기에 유언대로 아버지의 산소 옆에다 흩뿌렸다. 어머니는 바람을 타고 훌훌 어디론가 날아갔다.
누군가 죽은 이가 문득 생각날 때는 그 영혼이 저를 찾아온 거라고 말했다.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들의 체취가 훅훅 끼쳐질 때가 있다. 어머니는 저세상에서 아들을 만나 무척 행복하겠지만, 두고 간 피붙이들이 또 그리워서 가끔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싶다.
어느 날 창문을 열면 어머니에게서 나던 흙냄새와 꽃냄새와 땀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 와 나를 와락 덮친다. 잘살고 있느냐고, 그리웠다고.
어머니가 가신 뒤에도 일 년에 한 번은 고향 집엘 갔었다. 행여 내가 가는 날 어머니도 오실까 하고. 누가累家의 체취가 어머니를 닮았는지 어머니 체취가 누가에 배었는지 흠씬 취하곤 하였다. 이제는 집이 거기 있었다는 흔적만 남긴 채 빈 터가 되어버렸다. 낱낱이 흩어진 누가의 조각들이 풀숲에 덮이고 그 많은 추억도 나의 가슴속으로 옮겨놓았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마지막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불현듯 고향 집이 생각나면 그리우니 한 번 다녀가라는 고향의 기별인 줄 알고 달려가서 만나 보아야겠다.

EDITOR 편집팀

최명임 작가
이메일 : cmi3057@naver.com
2014년 문학저널 신인상
충북수필문학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산문 회원, 내육문학회원 / 충청타임즈 ‘생의 한가운데’ 필진(전)
청주교차로 신문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필진(현)
우리 숲 이야기 공모전 수상
추억의 우리 농산물 이야기 공모전 수상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
수필집 빈 둥지에 부는 바람, 언어를 줍다
충북수필문학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산문 회원, 내육문학회원 / 충청타임즈 ‘생의 한가운데’ 필진(전)
청주교차로 신문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필진(현)
우리 숲 이야기 공모전 수상
추억의 우리 농산물 이야기 공모전 수상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
수필집 빈 둥지에 부는 바람, 언어를 줍다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9-11 08:57:19

-
2024-08-07 08:52:50

-
2024-07-03 08:52:30

-
2024-05-29 09:05:27

-
2024-04-03 08:57:31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9-19 09:01:12

-
2024-09-12 09: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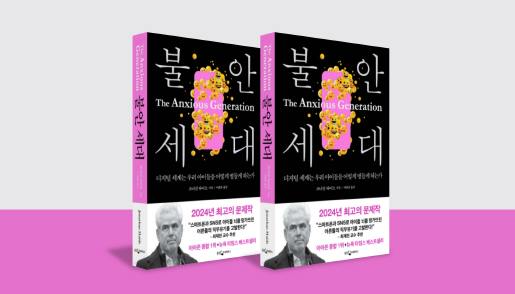
-
2024-09-12 08:50:40

-
2024-09-11 08:57:19

-
2024-09-06 09: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