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최명임 작가
cmi3057@naver.com
2021-09-01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가지치기하다가
'글. 최명임'
그가 배롱나무 무용한 날개를 잘라내려고 한다. 나무는 통증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찌 감당하려나. 언젠가는 성장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오늘은 눈물깨나 흘려야 할 거다.
탁, 탁 가위질이 끝난 자리에 허연 핏물이 배어 나온다. 멀대 같은 나무 정수리에 남은 서너 가지가 오롯한데 한편에선 흐느낌이 들린다. 내가 없는 사이 이웃과 경계 목으로 서 있는 플라타너스를 가지 하나 없이 몸통만 남겨 놓았다. 놀라 물었더니 눈치 없이 옆집 고추밭을 침범해서 그랬다고 머쓱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적당히 다스리지!”
그와 나는 ‘적당히’란 말을 놓고 자주 티격태격한다. 세상사가 알맞음의 기준만 지키면 금상첨화겠지만, 너나없이 아집이 끼어들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몇 년째 가지치기할 때마다 옥신각신하는데 마음을 접자, 체념했다가도 기어이 한마디 하고 만다.
우리는 다만 나무가 반듯하게 성장하고 실한 열매를 맺음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사람과 나무가, 나무와 나무가 두루 평화로이 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다. 우리 부부도 달고 있으면 상대방을 쿡쿡 찌르기나 하는 가지들 잘라 버리면 한층 성숙할 텐데 가위 날은 언제나 밖을 향해 있다.

조경 기사를 남편으로 둔 지인의 정원에는 몸통이 우람한 나무가 있다. 부부가 적당히 타협한 결과물이라 그 아래 작은 나무와 화초가 해를 받아 평화롭다. 수형이 얼마나 멋있는지 수백 아니 기천만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자랑한다. 우리도 가위 방향을 돌려 자신을 다듬어가면 그 가치를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텐데. 애당초 가위의 출현은 나 아닌 다른 무엇을 자를 목적이었으니 방향 전환이 어려운 것이다.
봄이 충동질을 했나, 플라타너스가 가지를 뻗기 시작했다. 그만큼 당했으면 절제할 법도 한데 사방팔방으로 불거져 나온다. 조만간 옆집 밭에 가야 할 볕을 독식할 것 같다. 남편은 지켜보다 분명 가위를 들 텐데 두 아집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가지치기가 끝나면 그는 언제나 만족한 웃음을 띠고 둘러본다. 나는 불만을 말하고 싶지만, 입을 꾹 다문다. 이참에 그의 불뚝 성질과 아집도 툭툭 처 냈으면 좋겠다. 그는 매사 자기중심적이고 길들지 않은 야생마 같다. 어머니는 한 번 놓치고 얻은 아들이라 퍽 대단하게 여기시고 항상 ‘우리 대장’이라고 부른다. 동생들은 불만 아닌 불만을 뱉어내는데 어려서부터 그는 많은 식구 중에서 서열 1위였단다. 그가 조선의 왕으로 태어났더라면 필경 대비마마의 치우친 사랑도 한몫해서 성군이든 폭군이든 역사에 한 획을 긋지 않았을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민심이 심히 동요할 그 자리, 상상이라 다행이다.
남편의 환갑날 어머님이 누가 들을세라 입안 소리로 말씀하셨다. “사내는 환갑이 되어야 철든다는데.” 아들 역성만 들던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은 ‘에미야, 그 비위 다 맞추고 사느라 고생했다.’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새겨들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나무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진중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리라. 태백산 정상에 늙은 주목은 천년을 거기 서 있었다. 산은 분명 몸을 낮추 살아야 한다고 언질을 주었을 텐데 상흔이 군데군데 박여있었다. 천년이라면 노대바람에 살이 패이고 무수히 잘린 날개로 울음이 산허리를 적셨을 터이다. 노목은 드디어 나지막이 몸을 낮추고 신선처럼 좌정하고 있었다. 아득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탄식하시지는 않을까! 발길을 붙잡아놓고 말이 없는데 죽비에 맞은 듯 내가 점점 작아졌다.
그가 달라진 시점이 환갑이었을까. 육십갑자를 돌아 처음 태어난 해로 다시 왔으니 일리가 있겠다. 금단증상에 얼굴이 벌게지기는 하지만, 아집도, 무작정 내닫던 야생마 기질도 한풀 꺾이고 말끝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어감이 깊어진다.
나를 나무로 형상화해 놓고 보니 가지만 무성하다. 그는 잘 참다가도 답답하다고 언성을 높이고 나는 그것이 나인 양 꼭 붙들고 있다. 그 가지 툭툭 처 내야 남은 우리 부부의 삶이 한결 유연해지겠다. 형체도 없는 가위 앞에서 끈덕지게 저항하고, 돌아서면 또 불거져 나올 테지만, 마음만 놓지 않으면 가능하리라.
부족한 점 끌어안고 살자고 그와 약속한 세월이 어느새 사십 년이다. 때로 엉켜있는 등나무 줄기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곡절은 많았어도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그도 그랬을 거다. 부부는 억겁에 쌓여 온 업으로 이번 생에 인연이 닿은 거라고 했다. 기록도 없는 인연의 줄기를 따라 예까지 왔으니 사는 동안 버리지 못한 습은 너그러이 수용하고 서로 보듬고 가야 하리라.
배롱나무는 허연 핏물로 키운 분홍색 꽃 무리를 달고 부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다. 나도 나이만큼 부대낀 시간으로 한결 조율이 수월한데 가지치기하다 넋두리 한번 해보았다.
우리는 모두 불손한 가지들을 잔뜩 달고 세상이란 거목에 매달려 팔랑대고 있는 것을….
EDITOR AE류정미
탁, 탁 가위질이 끝난 자리에 허연 핏물이 배어 나온다. 멀대 같은 나무 정수리에 남은 서너 가지가 오롯한데 한편에선 흐느낌이 들린다. 내가 없는 사이 이웃과 경계 목으로 서 있는 플라타너스를 가지 하나 없이 몸통만 남겨 놓았다. 놀라 물었더니 눈치 없이 옆집 고추밭을 침범해서 그랬다고 머쓱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적당히 다스리지!”
그와 나는 ‘적당히’란 말을 놓고 자주 티격태격한다. 세상사가 알맞음의 기준만 지키면 금상첨화겠지만, 너나없이 아집이 끼어들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몇 년째 가지치기할 때마다 옥신각신하는데 마음을 접자, 체념했다가도 기어이 한마디 하고 만다.
우리는 다만 나무가 반듯하게 성장하고 실한 열매를 맺음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사람과 나무가, 나무와 나무가 두루 평화로이 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다. 우리 부부도 달고 있으면 상대방을 쿡쿡 찌르기나 하는 가지들 잘라 버리면 한층 성숙할 텐데 가위 날은 언제나 밖을 향해 있다.

조경 기사를 남편으로 둔 지인의 정원에는 몸통이 우람한 나무가 있다. 부부가 적당히 타협한 결과물이라 그 아래 작은 나무와 화초가 해를 받아 평화롭다. 수형이 얼마나 멋있는지 수백 아니 기천만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자랑한다. 우리도 가위 방향을 돌려 자신을 다듬어가면 그 가치를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텐데. 애당초 가위의 출현은 나 아닌 다른 무엇을 자를 목적이었으니 방향 전환이 어려운 것이다.
봄이 충동질을 했나, 플라타너스가 가지를 뻗기 시작했다. 그만큼 당했으면 절제할 법도 한데 사방팔방으로 불거져 나온다. 조만간 옆집 밭에 가야 할 볕을 독식할 것 같다. 남편은 지켜보다 분명 가위를 들 텐데 두 아집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가지치기가 끝나면 그는 언제나 만족한 웃음을 띠고 둘러본다. 나는 불만을 말하고 싶지만, 입을 꾹 다문다. 이참에 그의 불뚝 성질과 아집도 툭툭 처 냈으면 좋겠다. 그는 매사 자기중심적이고 길들지 않은 야생마 같다. 어머니는 한 번 놓치고 얻은 아들이라 퍽 대단하게 여기시고 항상 ‘우리 대장’이라고 부른다. 동생들은 불만 아닌 불만을 뱉어내는데 어려서부터 그는 많은 식구 중에서 서열 1위였단다. 그가 조선의 왕으로 태어났더라면 필경 대비마마의 치우친 사랑도 한몫해서 성군이든 폭군이든 역사에 한 획을 긋지 않았을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민심이 심히 동요할 그 자리, 상상이라 다행이다.
남편의 환갑날 어머님이 누가 들을세라 입안 소리로 말씀하셨다. “사내는 환갑이 되어야 철든다는데.” 아들 역성만 들던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은 ‘에미야, 그 비위 다 맞추고 사느라 고생했다.’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새겨들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나무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진중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리라. 태백산 정상에 늙은 주목은 천년을 거기 서 있었다. 산은 분명 몸을 낮추 살아야 한다고 언질을 주었을 텐데 상흔이 군데군데 박여있었다. 천년이라면 노대바람에 살이 패이고 무수히 잘린 날개로 울음이 산허리를 적셨을 터이다. 노목은 드디어 나지막이 몸을 낮추고 신선처럼 좌정하고 있었다. 아득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탄식하시지는 않을까! 발길을 붙잡아놓고 말이 없는데 죽비에 맞은 듯 내가 점점 작아졌다.
그가 달라진 시점이 환갑이었을까. 육십갑자를 돌아 처음 태어난 해로 다시 왔으니 일리가 있겠다. 금단증상에 얼굴이 벌게지기는 하지만, 아집도, 무작정 내닫던 야생마 기질도 한풀 꺾이고 말끝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어감이 깊어진다.
나를 나무로 형상화해 놓고 보니 가지만 무성하다. 그는 잘 참다가도 답답하다고 언성을 높이고 나는 그것이 나인 양 꼭 붙들고 있다. 그 가지 툭툭 처 내야 남은 우리 부부의 삶이 한결 유연해지겠다. 형체도 없는 가위 앞에서 끈덕지게 저항하고, 돌아서면 또 불거져 나올 테지만, 마음만 놓지 않으면 가능하리라.
부족한 점 끌어안고 살자고 그와 약속한 세월이 어느새 사십 년이다. 때로 엉켜있는 등나무 줄기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곡절은 많았어도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그도 그랬을 거다. 부부는 억겁에 쌓여 온 업으로 이번 생에 인연이 닿은 거라고 했다. 기록도 없는 인연의 줄기를 따라 예까지 왔으니 사는 동안 버리지 못한 습은 너그러이 수용하고 서로 보듬고 가야 하리라.
배롱나무는 허연 핏물로 키운 분홍색 꽃 무리를 달고 부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다. 나도 나이만큼 부대낀 시간으로 한결 조율이 수월한데 가지치기하다 넋두리 한번 해보았다.
우리는 모두 불손한 가지들을 잔뜩 달고 세상이란 거목에 매달려 팔랑대고 있는 것을….

EDITOR AE류정미

최명임 작가
이메일 : cmi3057@naver.com
2014년 문학저널 신인상
충북수필문학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산문 회원, 내육문학회원 / 충청타임즈 ‘생의 한가운데’ 필진(전)
청주교차로 신문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필진(현)
우리 숲 이야기 공모전 수상
추억의 우리 농산물 이야기 공모전 수상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
수필집 빈 둥지에 부는 바람, 언어를 줍다
충북수필문학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산문 회원, 내육문학회원 / 충청타임즈 ‘생의 한가운데’ 필진(전)
청주교차로 신문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필진(현)
우리 숲 이야기 공모전 수상
추억의 우리 농산물 이야기 공모전 수상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
수필집 빈 둥지에 부는 바람, 언어를 줍다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9-11 08:57:19

-
2024-08-07 08:52:50

-
2024-07-03 08:52:30

-
2024-05-29 09:05:27

-
2024-04-03 08:57:31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9-19 09:01:12

-
2024-09-12 09: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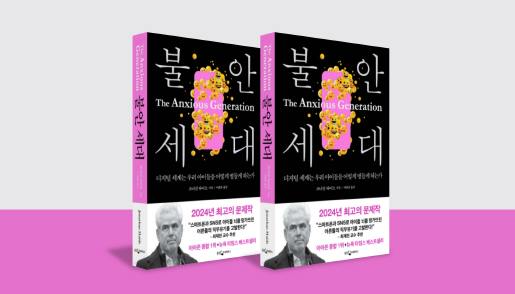
-
2024-09-12 08:50:40

-
2024-09-11 08:57:19

-
2024-09-06 09: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