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최명임 작가
cmi3057@naver.com
2023-04-19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화해의 초대장
'글. 최명임'
두 번째 풍파가 밀어닥쳤을 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둥지는 남의 것이 되고 낯선 처마 밑에서 전전긍긍하며 떠돌이처럼 살았다. 행복지수가 바닥을 쳤다. 생일을 기억하는 미역국은 소태같이 쓰고 억지로 먹는 밥은 속을 훑어 내렸다. 삶의 그래프가 요동칠 때마다 심한 오한을 느꼈다. 독불장군인 그의 성미도 요동치는 일상을 따라 치솟았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와 나 사이에도 작고 큰 소란이 일었다.
예순 번째 생일날 하얀 이밥에 달콤한 미역국을 먹었다. 36년의 독재를 내려놓고 사랑하며 살자 하더니 그가 미역국을 끓인다. 화해의 초대장이다. 넌지시 넘겨다보니 진국을 우려낸다며 고기를 삶는데 핏물과 기름기가 빠져나와 구정물처럼 뿌옇다. 한번 수루루 끓였다 버리고 새 물을 부어 끓여야 한다고 말해 줄 걸…. 다시마 몇 조각을 넣었더니 이물은 덩어리로 엉기고 국물이 말갛게 걸러진다. 내 혈관 속에 엉겨 붙어 순환을 방해하던 기름 덩이와 숨어든 바이러스가 술렁거린다.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저 사람도 세월이란 필터에 저렇게 걸러진 것이야.’ 그는 모든 걸림돌과 제약을 뛰어넘은 듯 마음이 가벼워보인다.

돌아보니 먹구름은 이유가 있었다. 태풍에 부서지고 놓쳐버린 것들은 상실이 아니었다. 더 큰 것을 위한 신의 사랑 법에 무의식의 내가 부응한 것이다. 아이들은 어리광을 벗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길을 나섰고, 서슬 퍼런 파랑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저들 나름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수수께끼 같은 숙제하나 풀고 나더니 아이들은 돌콩 같이 단단해졌다. 그의 그늘에서 안주했던 나도 물렁한 속을 다잡고 암팡지게 세상과 마주 서는 법을 배웠다.
열두 고개를 넘어 와 헐떡거리던 숨을 가라앉히고 둔덕에 퍼질러 앉아 햇살을 받는다. 순풍이 곁들인 언덕에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허구한 날 뜨는 해도 먹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순간은 더없이 빛나 보이는 법, 따가운 햇살에 눅눅했던 가슴을 펴 말린다.
악을 쓰며 사느라 내 안의 필터가 방전된 것일까. 이 평화로운 일상을 툭 건드리는 것이 있다. 마음에 남은 찌꺼기가 분란을 일으키고 치유 불량인 채로 숨어 있던 생채기가 뜬금없이 들썩댄다. 허기가 지고 맥이 빠지면 쓸데없이 냉장고 문 여닫기를 몇 차례나 하고 달달한 먹거리와 탄수화물로 허기를 채운다. 몸집은 자꾸만 불고 잠자리에 들면 속없는 포만으로 공허함이 뼛속 깊이 파고든다.
이 일상의 평화를 겁탈당하기 전에 내 혈관 속의 바이러스를 걸러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나를 파고 들어가 너겁이 낀 오물을 말끔히 걸러 내어야겠다.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푸른 혈액이 나의 온몸을 돌면 내적 평화도 맛보게 될 테니까.
그녀가 늦은 오후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러 왔다. 언제 보아도 톡톡 튀는 그녀의 언어와 환한 웃음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묵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는 기기가 감당할 용량을 불신하는데 그녀는 누누이 공기청정기의 능력을 강조한다. 탁한 공기는 새 필터를 통해 시나브로 걸러지고 만성기관지염으로 거칠어진 내 호흡도 잦아들 것이라니 믿어보련다. 필터 교체 주기는 60일이란다. 주기에 맞추어 그녀가 방문하고 새 필터가 작동하는 날은 그녀 말처럼 호흡이 한결 수월한 것 같다.

사람의 60년도 전환이 필요한 주기일까. 마음이 시끄러운 까닭은 예순 해 나를 방치한 잘못이려니. 내 안의 필터가 실증과 허증을 오가며 방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필터링이 필요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육신은 물론 정서적 허기를 뿌듯하게 채우다 보면 필터는 재생하고 잡다한 바이러스는 모두 걸러질 것이다.
낯가림 심한 구두를 꺼내어 보송하게 닦았다. 속을 들킬까 봐 얼굴에 분을 바르고 색깔 옷을 꺼내 입고 눈여겨보았던 7번가를 찾아들었다. 그곳엔 사고의 의관을 갖춘 선비가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화석이 되어버린 가슴들을 건네받은 노익장은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 풍경들이 후끈한 열감으로 내 삶을 비집고 들어왔다. 급체로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되지 못한 언어들이 머릿속에 나뒹굴었다. 내 안의 나를 찾아 떠나는 초행길에 합류한 동무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가슴은 기대로 설레는 듯했다. 미맹을 깨우는 소리와 ‘나’를 찾아 헤매는 아우성은 점점 커지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비범한 진리와 아주 잠깐이나마 타협하기에 이르렀다. 죽어 널브러진 나의 부음이 어렴풋이 들리는 듯 했다.
한술 밥은 금방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없지만, 안도감과 함께 허기를 가시게 하는 마력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 내 혈관 속의 잡동사니들이 필터를 통하여 시나브로 걸러지고 푸른 핏빛이 온몸을 돌면 못다 채운 허기가 포만에 들리라.
시간은 짧고 가야 할 길은 아득한데 그곳에 가면 정겨운 이가 호롱불을 들고 서 있다. ‘그대를 위함’이라는 팻말을 달고 있다. 희망이라는 그를 사랑한다.
속을 든든히 채우고 길 나설 채비를 한다. 다시 풍파를 만난다 해도 크게 동요할 것 같지 않은 나이, 이순이다. 내가 나에게 건네준 화해의 초대장을 받아 들고 나서는 길은 발걸음부터 가붓하다. 순해진 귀로 거센 바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테니, 나와 내가 화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듯싶다.
EDITOR AE류정미
예순 번째 생일날 하얀 이밥에 달콤한 미역국을 먹었다. 36년의 독재를 내려놓고 사랑하며 살자 하더니 그가 미역국을 끓인다. 화해의 초대장이다. 넌지시 넘겨다보니 진국을 우려낸다며 고기를 삶는데 핏물과 기름기가 빠져나와 구정물처럼 뿌옇다. 한번 수루루 끓였다 버리고 새 물을 부어 끓여야 한다고 말해 줄 걸…. 다시마 몇 조각을 넣었더니 이물은 덩어리로 엉기고 국물이 말갛게 걸러진다. 내 혈관 속에 엉겨 붙어 순환을 방해하던 기름 덩이와 숨어든 바이러스가 술렁거린다.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저 사람도 세월이란 필터에 저렇게 걸러진 것이야.’ 그는 모든 걸림돌과 제약을 뛰어넘은 듯 마음이 가벼워보인다.

돌아보니 먹구름은 이유가 있었다. 태풍에 부서지고 놓쳐버린 것들은 상실이 아니었다. 더 큰 것을 위한 신의 사랑 법에 무의식의 내가 부응한 것이다. 아이들은 어리광을 벗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길을 나섰고, 서슬 퍼런 파랑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저들 나름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수수께끼 같은 숙제하나 풀고 나더니 아이들은 돌콩 같이 단단해졌다. 그의 그늘에서 안주했던 나도 물렁한 속을 다잡고 암팡지게 세상과 마주 서는 법을 배웠다.
열두 고개를 넘어 와 헐떡거리던 숨을 가라앉히고 둔덕에 퍼질러 앉아 햇살을 받는다. 순풍이 곁들인 언덕에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허구한 날 뜨는 해도 먹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순간은 더없이 빛나 보이는 법, 따가운 햇살에 눅눅했던 가슴을 펴 말린다.
악을 쓰며 사느라 내 안의 필터가 방전된 것일까. 이 평화로운 일상을 툭 건드리는 것이 있다. 마음에 남은 찌꺼기가 분란을 일으키고 치유 불량인 채로 숨어 있던 생채기가 뜬금없이 들썩댄다. 허기가 지고 맥이 빠지면 쓸데없이 냉장고 문 여닫기를 몇 차례나 하고 달달한 먹거리와 탄수화물로 허기를 채운다. 몸집은 자꾸만 불고 잠자리에 들면 속없는 포만으로 공허함이 뼛속 깊이 파고든다.
이 일상의 평화를 겁탈당하기 전에 내 혈관 속의 바이러스를 걸러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나를 파고 들어가 너겁이 낀 오물을 말끔히 걸러 내어야겠다.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푸른 혈액이 나의 온몸을 돌면 내적 평화도 맛보게 될 테니까.
그녀가 늦은 오후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러 왔다. 언제 보아도 톡톡 튀는 그녀의 언어와 환한 웃음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묵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는 기기가 감당할 용량을 불신하는데 그녀는 누누이 공기청정기의 능력을 강조한다. 탁한 공기는 새 필터를 통해 시나브로 걸러지고 만성기관지염으로 거칠어진 내 호흡도 잦아들 것이라니 믿어보련다. 필터 교체 주기는 60일이란다. 주기에 맞추어 그녀가 방문하고 새 필터가 작동하는 날은 그녀 말처럼 호흡이 한결 수월한 것 같다.

사람의 60년도 전환이 필요한 주기일까. 마음이 시끄러운 까닭은 예순 해 나를 방치한 잘못이려니. 내 안의 필터가 실증과 허증을 오가며 방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필터링이 필요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육신은 물론 정서적 허기를 뿌듯하게 채우다 보면 필터는 재생하고 잡다한 바이러스는 모두 걸러질 것이다.
낯가림 심한 구두를 꺼내어 보송하게 닦았다. 속을 들킬까 봐 얼굴에 분을 바르고 색깔 옷을 꺼내 입고 눈여겨보았던 7번가를 찾아들었다. 그곳엔 사고의 의관을 갖춘 선비가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화석이 되어버린 가슴들을 건네받은 노익장은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 풍경들이 후끈한 열감으로 내 삶을 비집고 들어왔다. 급체로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되지 못한 언어들이 머릿속에 나뒹굴었다. 내 안의 나를 찾아 떠나는 초행길에 합류한 동무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가슴은 기대로 설레는 듯했다. 미맹을 깨우는 소리와 ‘나’를 찾아 헤매는 아우성은 점점 커지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비범한 진리와 아주 잠깐이나마 타협하기에 이르렀다. 죽어 널브러진 나의 부음이 어렴풋이 들리는 듯 했다.
한술 밥은 금방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없지만, 안도감과 함께 허기를 가시게 하는 마력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 내 혈관 속의 잡동사니들이 필터를 통하여 시나브로 걸러지고 푸른 핏빛이 온몸을 돌면 못다 채운 허기가 포만에 들리라.
시간은 짧고 가야 할 길은 아득한데 그곳에 가면 정겨운 이가 호롱불을 들고 서 있다. ‘그대를 위함’이라는 팻말을 달고 있다. 희망이라는 그를 사랑한다.
속을 든든히 채우고 길 나설 채비를 한다. 다시 풍파를 만난다 해도 크게 동요할 것 같지 않은 나이, 이순이다. 내가 나에게 건네준 화해의 초대장을 받아 들고 나서는 길은 발걸음부터 가붓하다. 순해진 귀로 거센 바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테니, 나와 내가 화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듯싶다.

EDITOR AE류정미

최명임 작가
이메일 : cmi3057@naver.com
2014년 문학저널 신인상
충북수필문학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산문 회원, 내육문학회원 / 충청타임즈 ‘생의 한가운데’ 필진(전)
청주교차로 신문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필진(현)
우리 숲 이야기 공모전 수상
추억의 우리 농산물 이야기 공모전 수상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
수필집 빈 둥지에 부는 바람, 언어를 줍다
충북수필문학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산문 회원, 내육문학회원 / 충청타임즈 ‘생의 한가운데’ 필진(전)
청주교차로 신문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필진(현)
우리 숲 이야기 공모전 수상
추억의 우리 농산물 이야기 공모전 수상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
수필집 빈 둥지에 부는 바람, 언어를 줍다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9-11 08:57:19

-
2024-08-07 08:52:50

-
2024-07-03 08:52:30

-
2024-05-29 09:05:27

-
2024-04-03 08:57:31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9-19 09:01:12

-
2024-09-12 09: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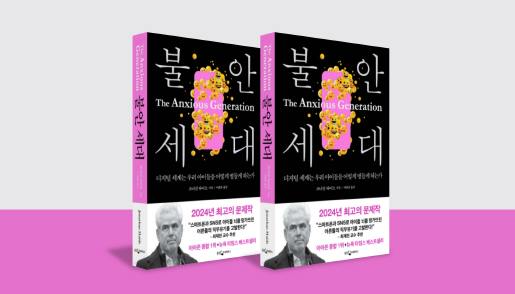
-
2024-09-12 08:50:40

-
2024-09-11 08:57:19

-
2024-09-06 09: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