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종희 작가
essay0228@hanmail.net
2024-08-14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이모의 가방
'글.박종희'
며칠 전부터 벼르던 가방을 손질하려고 서랍을 여니 대여섯 개의 가방이 다소곳이 놓여 있다. 꽃분홍색, 군청색, 갈색, 베이지색 등, 평소 예쁘게 들고 다니던 가방들이 서랍 안에서는 추리해 보인다.
나는 화장품이나 옷에는 관심이 적은 데 가방 욕심이 많다. 오죽하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색깔별로 두 개를 살 정도다. 겨우내 들고 다니던 갈색 가방도 큰마음먹고 산 것이라 처음엔 신주 모시듯 귀하게 들고 다녔는데 어느새 애정이 식어버렸다.
가방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숨을 쉬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들지 않은 것은 모양까지 변형되어 보기 흉했다. 신문지를 뭉쳐 넣어 모양을 잡고 헝겊 질을 하는데 문득 가방을 목숨처럼 여기던 셋째 이모 생각이 났다.
외할머니는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들만 낳으면 다섯 살이 되기도 전에 죽었다. 딸 여섯에 아들 넷을 낳았지만, 아들은 번번이 다섯 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외할머니의 가슴에 돌덩이를 매달았다. 그런 외할머니한테 셋째 이모가 불구로 태어났다.
말도 어눌하고 걷는 것이 불편한 이모는 대문까지 나오는 것이 한계였다. 늘 집에서만 지내던 이모도 나이가 차고 서른이 넘으니 시집을 가고 싶어 했다. 가끔 친정에 다니러 오는 언니나 형부, 조카들을 보며 가정을 이룬 자매들을 부러워했다.
“바보가 어떻게 시집을 가. 누가 너 같은 것 데려가기나 한대?”라며 이모한테 마음에도 없는 구박을 하던 외할머니가 하루는 이모의 신랑감을 데려왔다. 눈에 띄게 키가 작고 왜소해 한눈에도 좀 모자라 보였다. 외할머니는 일곱 살배기 딸이 딸린 신랑 집에 꽤 많은 땅을 주는 조건으로 이모와 식을 올리게 했다.
서로 처지를 알고 혼인했으니 잘 살 거로 믿었던 이모가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 집으로 돌아왔다. 외할머니는 시집가서 1년도 못 살고 쫓겨 온 이모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괜히 땅만 날려버린 것이 분하고 이모 시댁이 괘씸하기도 한 외할머니는 그 분풀이를 이모한테 했다.

친정으로 돌아와 다시 외톨이가 된 이모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가방이었다. 이모는 결혼 후 이모부가 장날에 사다 준 흔한 고리 장식 하나 달리지 않은 검은색 가방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어린아이 기저귀 가방만큼 컸지만, 이모가 태어나서 처음 가져 보는 이모만의 가방이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살을 맞대고 살던 남편이 사준 가방이니 오죽했을까.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모는 마치 남편을 품에 안듯 가방에 집착했다. 잠을 잘 때나 잠깐 대문까지 나갈 때도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이모를 보고 외할머니는 버림받은 놈한테 정을 놓지 못한다며 당장 가방을 내다 버리라고 성화를 하셨다.
혼인신고를 했으니 집에서 쫓아냈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데리러 온다던 이모부는 몇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없었다. 그 사이 화병이 있던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덩그러니 큰집에는 외할머니와 성치 못한 이모 두 사람뿐이었다. 비록 몸은 재지 못했지만, 이모는 외할머니를 지성으로 모셨다. 말은 모질게 했지만, 할머니도 아픈 손가락인 딸이 안쓰러워 당신보다 이모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
정말, 외할머니의 짐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일까. 이모는 마흔 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고가 나던 날도 이모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차에 치여 가방끈이 떨어져 나갔다. 가방도 이모처럼 불구가 된 것이다. 가방 속에는 이모부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과 엄마와 이모들이 준 용돈이 꼬깃꼬깃 접힌 채 꽤 많이 들어 있었다. 평소에 가방엔 손도 못 대었는데, 그토록 같이 살고 싶어 하던 이모부의 사진 때문에 더 애착을 뒀던 것 같다.
잠을 잘 때도 팔에 끌어안고 잘 만큼 가방을 떼어놓지 못하더니 가방은 마지막까지 이모와 함께했다. 가방만이 이모의 마지막 길을 동행했을 뿐 누구도 이모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할머니는 이모의 유골을 이모가 애지중지 아끼던 가방에 넣어 주었다. 이모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같이 다녔던 가방이 마지막 가는 길도 같이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방의 운명도 기구했다.

사람의 목숨이 그리 허망할까. 그 작은 가방 하나에도 다 못 채우니. 화장장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이모의 유골이 담긴 가방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하얀 광목 보자기에 싸인 이모의 뼛가루를 넣어둔 가방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누구보다 자기를 아껴준 것을 아는지 금방 빻아 뜨거운 뼛가루에서 김이 서려 가방 거죽에도 축축하게 물기가 번졌다. 이모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살아서는 이모에게 몸을 맡기던 가방이 마지막 길에는 반대로 이모가 가방에 짐이 되었다. 이모가 가방을 든 것이 아니라 가방이 이모의 눈물로 얼룩진 방이 되어 이모를 담고 떠났다. 이모가 떠나고 이듬해에 그렇게 정정하던 외할머니도 세상을 뜨셨다.
싫증 나 내버려 두었을 때는 초라해 보이던 가방을 닦아 놓으니 금세 새 가방처럼 빛이 난다. 가방마다 사연이 있듯 사들일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이렇게 나와의 추억이 깃든 가방을 정리할 때면 가끔 이모와 검은색 낡은 가방이 생각난다.
이모는 가방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가방을 사준 이모부를 사랑했던 것 같다. 이모는 지금쯤 이모부를 만났을까. 봄바람이 불고 여기저기서 하얀 목련이 손짓할 때면 손때 묻어 반질반질한 가방을 메고 절룩거리며 다가와 반기던 이모가 많이 보고 싶다.
EDITOR 편집팀
나는 화장품이나 옷에는 관심이 적은 데 가방 욕심이 많다. 오죽하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색깔별로 두 개를 살 정도다. 겨우내 들고 다니던 갈색 가방도 큰마음먹고 산 것이라 처음엔 신주 모시듯 귀하게 들고 다녔는데 어느새 애정이 식어버렸다.
가방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숨을 쉬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들지 않은 것은 모양까지 변형되어 보기 흉했다. 신문지를 뭉쳐 넣어 모양을 잡고 헝겊 질을 하는데 문득 가방을 목숨처럼 여기던 셋째 이모 생각이 났다.
외할머니는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들만 낳으면 다섯 살이 되기도 전에 죽었다. 딸 여섯에 아들 넷을 낳았지만, 아들은 번번이 다섯 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외할머니의 가슴에 돌덩이를 매달았다. 그런 외할머니한테 셋째 이모가 불구로 태어났다.
말도 어눌하고 걷는 것이 불편한 이모는 대문까지 나오는 것이 한계였다. 늘 집에서만 지내던 이모도 나이가 차고 서른이 넘으니 시집을 가고 싶어 했다. 가끔 친정에 다니러 오는 언니나 형부, 조카들을 보며 가정을 이룬 자매들을 부러워했다.
“바보가 어떻게 시집을 가. 누가 너 같은 것 데려가기나 한대?”라며 이모한테 마음에도 없는 구박을 하던 외할머니가 하루는 이모의 신랑감을 데려왔다. 눈에 띄게 키가 작고 왜소해 한눈에도 좀 모자라 보였다. 외할머니는 일곱 살배기 딸이 딸린 신랑 집에 꽤 많은 땅을 주는 조건으로 이모와 식을 올리게 했다.
서로 처지를 알고 혼인했으니 잘 살 거로 믿었던 이모가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 집으로 돌아왔다. 외할머니는 시집가서 1년도 못 살고 쫓겨 온 이모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괜히 땅만 날려버린 것이 분하고 이모 시댁이 괘씸하기도 한 외할머니는 그 분풀이를 이모한테 했다.

친정으로 돌아와 다시 외톨이가 된 이모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가방이었다. 이모는 결혼 후 이모부가 장날에 사다 준 흔한 고리 장식 하나 달리지 않은 검은색 가방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어린아이 기저귀 가방만큼 컸지만, 이모가 태어나서 처음 가져 보는 이모만의 가방이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살을 맞대고 살던 남편이 사준 가방이니 오죽했을까.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모는 마치 남편을 품에 안듯 가방에 집착했다. 잠을 잘 때나 잠깐 대문까지 나갈 때도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이모를 보고 외할머니는 버림받은 놈한테 정을 놓지 못한다며 당장 가방을 내다 버리라고 성화를 하셨다.
혼인신고를 했으니 집에서 쫓아냈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데리러 온다던 이모부는 몇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없었다. 그 사이 화병이 있던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덩그러니 큰집에는 외할머니와 성치 못한 이모 두 사람뿐이었다. 비록 몸은 재지 못했지만, 이모는 외할머니를 지성으로 모셨다. 말은 모질게 했지만, 할머니도 아픈 손가락인 딸이 안쓰러워 당신보다 이모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
정말, 외할머니의 짐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일까. 이모는 마흔 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고가 나던 날도 이모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차에 치여 가방끈이 떨어져 나갔다. 가방도 이모처럼 불구가 된 것이다. 가방 속에는 이모부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과 엄마와 이모들이 준 용돈이 꼬깃꼬깃 접힌 채 꽤 많이 들어 있었다. 평소에 가방엔 손도 못 대었는데, 그토록 같이 살고 싶어 하던 이모부의 사진 때문에 더 애착을 뒀던 것 같다.
잠을 잘 때도 팔에 끌어안고 잘 만큼 가방을 떼어놓지 못하더니 가방은 마지막까지 이모와 함께했다. 가방만이 이모의 마지막 길을 동행했을 뿐 누구도 이모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할머니는 이모의 유골을 이모가 애지중지 아끼던 가방에 넣어 주었다. 이모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같이 다녔던 가방이 마지막 가는 길도 같이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방의 운명도 기구했다.

사람의 목숨이 그리 허망할까. 그 작은 가방 하나에도 다 못 채우니. 화장장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이모의 유골이 담긴 가방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하얀 광목 보자기에 싸인 이모의 뼛가루를 넣어둔 가방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누구보다 자기를 아껴준 것을 아는지 금방 빻아 뜨거운 뼛가루에서 김이 서려 가방 거죽에도 축축하게 물기가 번졌다. 이모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살아서는 이모에게 몸을 맡기던 가방이 마지막 길에는 반대로 이모가 가방에 짐이 되었다. 이모가 가방을 든 것이 아니라 가방이 이모의 눈물로 얼룩진 방이 되어 이모를 담고 떠났다. 이모가 떠나고 이듬해에 그렇게 정정하던 외할머니도 세상을 뜨셨다.
싫증 나 내버려 두었을 때는 초라해 보이던 가방을 닦아 놓으니 금세 새 가방처럼 빛이 난다. 가방마다 사연이 있듯 사들일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이렇게 나와의 추억이 깃든 가방을 정리할 때면 가끔 이모와 검은색 낡은 가방이 생각난다.
이모는 가방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가방을 사준 이모부를 사랑했던 것 같다. 이모는 지금쯤 이모부를 만났을까. 봄바람이 불고 여기저기서 하얀 목련이 손짓할 때면 손때 묻어 반질반질한 가방을 메고 절룩거리며 다가와 반기던 이모가 많이 보고 싶다.

EDITOR 편집팀

박종희 작가
이메일 : essay0228@hanmail.net
2000년 『월간문학세계』수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전국시흥문학상, 매월당 문학상, 김포문학상
2015년 동양일보 신인문학상 당선
제1회 119 문화상 소설 최우수상 수상 외 다수
2008년 ~ 2019년까지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에 수필 연재
저서: 수필집 『가리개』『출가』
한국작가회의, 한국산문작가협회, 충북작가회의 회원
청주시, 세종시 수필창작 강사. 충북작가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
전국시흥문학상, 매월당 문학상, 김포문학상
2015년 동양일보 신인문학상 당선
제1회 119 문화상 소설 최우수상 수상 외 다수
2008년 ~ 2019년까지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에 수필 연재
저서: 수필집 『가리개』『출가』
한국작가회의, 한국산문작가협회, 충북작가회의 회원
청주시, 세종시 수필창작 강사. 충북작가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
본 칼럼니스트의 최근 글 더보기
-
2024-08-14 08:55:27

-
2024-07-10 08:47:30

-
2024-06-05 08:59:48

-
2024-04-17 09:15:39

-
2024-03-06 08:53:37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09-19 09:01:12

-
2024-09-12 09: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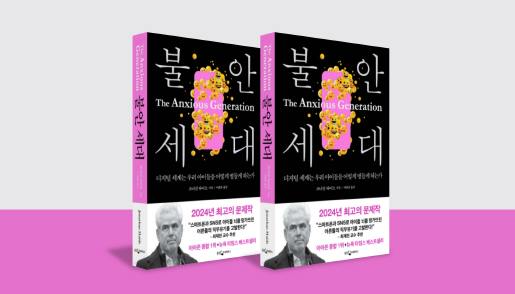
-
2024-09-12 08:50:40

-
2024-09-11 08:57:19

-
2024-09-06 09:09:24




